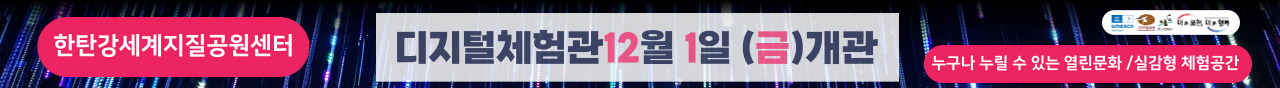■ 박경일 기자의 여행 - 명당 · 명승의 땅 포천 영평 8경
한탄강변 볏짚처럼 누운 ‘화적연’… 조선시대 기우제 지냈던 풍년 · 안녕의 상징
벼랑위 정자 ‘금수정’· 병풍 바위 ‘창옥병’… 박제가 등 유명 문인들 곳곳에 글 남겨
포천 = 글·사진 박경일 전임기자 parking@munhwa.com
경기 포천에는 ‘경흥대로’가 지난다. 경흥대로는 한양에서 출발해 함경북도 경흥(慶興)까지 이어주는 길이다. ‘동국여지도’를 완성한 300년 전의 지리학자 여암 신경준. 그는 경흥대로를 ‘조선의 6대 대로(大路)’ 중 두 번째로 분류했다. 그만큼 큰길이었다. 서울에서 수유리, 양주, 포천을 지나 김화까지, 거기서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인 강원도 회양, 함경남도 안변, 함흥, 함경북도 명천을 거쳐 경흥과 서수라까지 경흥대로가 이어졌다. 포천시청 앞을 지나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흥대로는, 포천의 대표적 문화 자산이다. 치열했던 6·25전쟁은 유적과 유물을 흔적도 없이 부숴버렸지만, ‘길’만큼은 없앨 수 없었다. 길이란 실재하는 공간 차원을 넘어서 자취와 방향의 표지판이자 소통의 역사나 의미에 가까우니까. 전쟁이 지나간 폐허 위로 길은 다시 만들어졌다.
# 포천의 문화적 자산…경흥대로
경흥대로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사람들이 걸었고, 물류가 유통됐다. 금강산으로 가던 선비들의 경유 코스이기도 했다. 경흥대로가 금강산 코스가 된 건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놓인 길이어서 큰 고개 없이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 보게 될 금강산에 대한 기대에 부푼 유람 길의 선비들에게 경흥대로 주변 명소들은 ‘기분 좋은 워밍업’의 장소였으리라.
그리고 지금 그 길 위로 한탄강 협곡을 따라 이어지는 지질공원의 명소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동선이 겹쳐지고 있다. 언젠가 북한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따라서 경흥까지 걸어볼 날에 대한 기대도 이 길에 스며있다.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게 된다면, 경흥대로는 또 어떤 의미가 될까.
경흥대로가 걷기 길인 역사탐방로로 다시 탄생했다. 작년 이맘때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경흥대로 옛 노선을 고증해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포천과 철원 경계인 금강산 김화 표시석까지 총 89.2㎞의 역사문화 탐방로 ‘경흥길’을 개통했다. 경흥길은 8개 코스다. 남에서 북의 순서로 길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영평천과 한탄강을 끼고 포천구간을 건너가는 7길과 8길이다. 8길을 다 걷고 나면 강원도로 바뀌는 행정구역 경계지점에서 ‘경흥길’ 표지판은 사라지고 만다. ‘경기도의 일’은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하지만 경흥대로의 끝은 함경북도 경흥. 그 길을 다 갈 수 없지만, 내친김에 한탄강의 물길을 따라 강원도 철원까지 건너가 보자.
# 금강산 유람에 앞선 몸풀기 명소
포천에는 강남(江南)과 강북(江北)이 있다. 이동면에서 발원한 영평천이 포천 땅을 남북으로 가르기 때문이다. 6·25전쟁의 격전이 지나간 자리라 남은 유적이 거의 없고 지금은 천변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 좀 흐트러진 감이 없지 않지만, 과거 영평천 일대는 ‘백운계(白雲溪)’라 일컬어질 정도로 경관 좋고 운치가 빼어난 장소였다. 금강산으로 유람가는 이들에게 이곳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포천은 빼어난 경관의 명승지로 인정받았다. 정조시대의 석학 서유구는 저서 ‘임원경제지’에서 포천에 우리나라 명당이나 명승이 16곳이나 있다고 적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그러던 곳이 전쟁의 참화가 지나가면서 고문서나 고가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명승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 그곳을 하나하나 짚어서 찾아가는 길이다.
영평천에는 ‘영평팔경’이 있다. 아니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경관 따위는 거들떠볼 여유 없이 길이 나고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전 정취의 대부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영평팔경을 감상하려면 상상력을 덧대는 게 요령이다.
산수 경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팔경’이니 ‘구경’이니 하는 곳이 꼭 있는 건 아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팔경이나 구경은 그렇게 이름 붙인 ‘그럴듯한 인물’이 있어야 비로소 만들어진다. 자연에 깃들어 사는 명망 높은 이가 팔경의 이름을 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글자를 새기거나 해야 비로소 팔경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일을 ‘경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영평팔경의 뒤에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박순과 전국의 명승마다 날아오를 듯한 글씨를 남긴 양사언이 있다. 그리고 금강산 유람 길에 만난 영평팔경 앞에서 찬탄을 금치 못했던 수많은 이들이 있다. 조선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 조선 후기 영의정을 지낸 미수 허목, 금강산만 여섯 번 다녀온 김창흡, 서슬 퍼런 항일 의병장 최익현….
효종 동생 ‘인평대군묘’엔 다섯 왕의 추도문… 거북 · 용 새겨진 비석 ‘감탄’
6 · 25 전쟁에도 살아남은 ‘경흥대로’… 총 89.2㎞ 지질 · 역사 탐방로 재탄생
# 화적연, 신성한 볏단의 바위
영평팔경의 제1경은 화적연이다. 한탄강 변에 거대한 물개처럼 누워있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 ‘벼 화(禾)’에 ‘쌓을 적(積)’을 써서 ‘화적(禾積)’이다. 바위가 볏단을 쌓아놓은 듯하다 해서 우리 말로는 ‘볏가리 소’라고 불렸다. 화적연은 영평팔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이다. 세월이 흘러도 기이한 바위의 모양이 변할 리 없기도 하고, 화적연이 한탄강 지질공원의 ‘첫 번째 명소’로도 손꼽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저 ‘기이한 바위’지만, 농경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볏짚 단 모양의 바위는 신성시됐다. 조선 후기 국가에서 주재하는 국행 기우제 12번째인 마지막 기우제를 여기 화적연에서 올린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화적연을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물로 본 것이다.
화적연 뒤에는 겸재 정선이 있다. 겸재는 서른일곱 살 때 금강산을 여행하며 그린 그림으로 화첩을 만들었다. 화첩은 아쉽게도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 일흔두 살이 된 그는 과거 화첩 속의 장소를 다시 그려서 서화첩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을 만들었다.
화첩에는 금강산과 그 길목에 위치한 명승을 그린 스물한 점의 그림이 실려있는데, 화첩 맨 앞의 첫 번째 그림이 바로 화적연이다. 바위 높이가 좀 과장된 듯하지만, 300여 년 전 그림과 지금의 모습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같다. 화첩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자칫 친일파 집안의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들어갈 뻔했는데, 젊은 골동품상이 구해서 간송 전형필에게 큰돈을 받고 팔았다는 뒷얘기가 있다.
# 수많은 글씨가 증명하는 명소
영평팔경 중에서 옛 모습이 남아있는 건 2경과 3경이다. 그나마 온전한 건 둘 다 ‘물 밖’의 경관이라서 그렇다. 3경부터 8경까지는 바뀐 물길과 지형으로 그저 이름만 남은 별것 없는 경관이다.
영평팔경 두 번째 경치는 금수정이다. 영평천 변 벼랑 위에 숨듯 들어서 있어 지금은 아는 이가 별로 없지만, 조선 말엽 임원경제지에서 ‘우리나라 3대 정자 중 하나’로 소개됐을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 정자는 한때 문인이자 서예가로 이름 높았던 양사언의 소유였다가 안동 김씨 일가에 소유권이 넘겨진 뒤에 여러 번 고쳐 지어졌다. 그러다 6·25전쟁 중에 불타버렸는데, 지금의 정자는 1989년에 복원한 것이다.
지금은 좀 초라해 보이지만 영평천 물길이 굽이치는 벼랑의 금수정이 내로라하는 명승이었다는 건, 정자 주변에 세워진 비석과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당대의 명사들이 천변 바위에 새긴 수많은 암각 글씨가 증명한다. 한석봉, 박제가, 양사언, 박세당, 김수항, 이덕형, 김창협이 금수정을 드나들었다.
금수정 주변에는 암각문도 많다. 한석봉이 쓴 ‘동천석문(洞天石門)’ 명나라 사신 허국의 글씨 ‘회란석(廻瀾石)’, 양사언이 쓴 ‘준암(尊巖)’…. 누구의 솜씨인지 알 수 없는 글씨까지 합치면 그 수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다.
정자 뒤에는 또 거대한 자연석에 ‘태산이 높다하되…’로 시작하는 양사언 시조를 새긴 비석도 있고, 안동 김씨가 대대로 거주하던 곳이란 의미로 세운 ‘안동 김씨 세천비’도 있다. 비석과 바위를 하나하나 짚어 읽어가며 아는 인물들의 이름과 맞춰 보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다.
# 바위에 새긴 풍류의 이름
영평팔경의 세 번째는 ‘창옥병(蒼玉屛)’이다. ‘푸를 창(蒼)’에 ‘구슬 옥(玉)’ 그리고 ‘병풍 병(屛)’ 자를 쓴다. 풀어본다면, 구슬처럼 맑은 강물이 병풍 같은 절벽을 휘돌아나간다는 뜻이다. 영평천 변의 거대한 바위 벼랑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벼랑을 마주 보고 있는 천변의 바위에 새겨진 암각문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영평천 변에는 사람 어깨쯤 높이의 바위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병풍 같은 바위에는 크고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 벼슬을 지낸 박순이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다 초가집을 짓고 머물 때 지었다는 ‘수경대(水鏡臺)’란 시도 있고, 선조임금이 박순의 인품을 품평해 쓴 ‘송균절조(松筠節操) 수월정신(水月情神)’이란 글귀를 옮겨 쓴 송시열의 글씨도 있다.
당대의 명필 한석봉 글씨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마침 한석봉이 절정의 기량을 뽐내던 시기였다.
‘청학대(靑鶴臺)’와 ‘백학대(白鶴臺)’란 글씨에는 ‘백학이 청학을 타고 가끔 물가에 나타난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고, ‘토운상(吐雲床)’이라 새긴 바위는 구름이 강물 위로 비추는 걸 감상하며 술상을 받으면 딱 좋을 자리다.
창옥병의 글씨는 단순한 풍류가 아니라, 이곳에서 말년을 보낸 박순의 자취이기도 하고, 그의 행적을 찾아온 후학들이 다녀간 자취이기도 하다.
창옥병 위쪽 마을에는 박순을 추모하기 위해 효종 때 창건한 옥병서원이 있다. 박순은 죽어 이곳 마을에 묻혔는데, 옥병서원 앞에 그의 죽음을 기리는 비석인 신도비가 있고, 여기서 500m쯤 더 들어간 마을 안쪽에 묘가 있다.
# 다섯 명의 왕이 친필로 애도하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 포천에는 인평대군 묘가 있다. 묘는 엄숙하면서도 단정하고, 그러면서도 우아한 느낌이다. 잘 설명하긴 어렵지만, 묘역에서는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다녀와 보시라 권하는 이유다.
인평대군 묘 앞에는 볼만한 비석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신도비다. 무덤 앞에 생전의 업적을 새겨 세우는 비석이 신도비다. 신도비는 3m가 넘는 크기도 인상적인 데다 석물의 완성도도 높다. 신도비를 지고 있는 거북 형상의 받침돌을 ‘귀부’라고 하는데, 생동감 넘치는 거북의 형상과 비석 머리 용 조각의 솜씨가 탄성이 나올 정도다.
나머지 두 개의 비석은 ‘치제문비’다. 치제문(致祭文)이란 공적이 있는 인물의 제사 때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해주면서 함께 내려준 추도의 글이다. 그러니까, 치제문비는 왕이 쓴 추도문을 새긴 비석을 말한다. 인평대군 묘 옆의 비각 안에는 두 개의 치제문비가 있다. 하나는 앞면에는 효종이, 뒷면에는 숙종이 지은 추도문을 새겨넣었다. 다른 하나는 맨 위에 영조, 아래엔 정조의 추도문을 새긴 것으로, 끝부분에는 나중에 새겨넣은 순조가 지은 추도문도 있다. 그러니까 인평대군 묘에서는 도합 다섯 명의 왕이 쓴 친필 제문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 왕의 글과 친필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임금들이 앞다퉈 제문을 쓴 인평대군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인평대군은 조선 인조의 셋째 아들이다.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끌려간 소현세자, 봉림대군(훗날 효종)의 동생이기도 하다. 인평대군도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선양에 볼모로 끌려갔다. 곧 풀려나긴 했지만 그 뒤에도 갖은 모멸 속에서 청나라를 오갔다.
# 명당일까 아닐까…인평대군 묘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과 조선의 왕가를 대놓고 무시했다.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었다. 말이 사신이지, 조선의 왕자 인평대군을 청나라는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잠자리가 없어 노숙을 밥 먹듯이 했을 정도다. 인평대군은 이런 식으로 선양에만 세 번, 연경은 아홉 번을 다녀왔다. 다 합치면 모두 열세 번이니, 해마다 한두 번씩은 청나라에 다녀온 셈이었다. 그때마다 인평대군은 갑질과 모욕을 견뎌야 했다. 청나라를 다녀오는 것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 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일도 도맡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거만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청나라 사신이 얼마나 ‘기피 보직’이었는지는, 당시 송시열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시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인평대군이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송시열은 효종에게 “선왕(인조)께서 동생(인평대군)을 잘 챙기라 하셨거늘, 형이 되어서 어찌 동생을 호랑이 굴에 보내 혹사하느냐”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마음고생을 하며 청나라를 오가고, 굽신거리며 사신을 맞이하는 사이에 인평대군의 몸과 마음은 상했다. 결국 서른다섯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병세가 악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효종이 직접 찾아갔으나 임종을 보지 못했다. 효종은 동생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효종이 인평대군의 집을 한동안 떠나지 않으려 했는데 신하들의 빗발치는 반대로 마지못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인평대군 묘역은 선조가 본래 자기가 묻힐 자리로 봐둔 곳이었다. 부인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 묫자리를 고르던 중 선조는 나중에 자신도 함께 묻힐 자리를 찾으라고 지관에게 지시하며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 “나는 천성이 산천이 깊고 경내가 그윽하며 겹겹이 둘러싸여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을 좋아한다. 만약 길가의 천박한 땅으로 비바람에 깎여져 벼랑이 있는 산이라면, 비록 아주 좋은 명당일지라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지세나 명당 못지않게 경관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찾았던 것이다.
그렇게 찾은 명당이 지금의 인평대군 묫자리다. 그런데 능 조성이 끝나가던 무렵 한 지관이 그곳이 ‘흉지’라는 상소를 올렸다. 못내 찜찜해 하던 선조는 결국 이곳을 포기하고 태조 이성계가 묻힌 건원릉 옆에다 묻힐 자리를 정했다. 그렇게 포천에는 인평대군이 묻히게 됐다. 그렇다면 이곳은 명당일까, 흉지일까. 인평대군의 6대손이 남연군이다. 남연군의 아들은 흥선대원군이고, 고종과 순종이 후손이다. 어찌 됐든 후손에서 잇따라 왕이 나왔다. 그게 과연 인평대군 묫자리의 기운 때문이었을까.
■ 창옥병의 시를 읽다
창옥병에는 영의정을 지내다 물러나 말년에 이곳에 은거한 박상의 시를 새긴 바위가 있다. 바위에 새긴 글씨는 조선 중기의 문신 김수증이 썼다. 시를 풀어보면 이렇다. “골짜기의 새소리 때때로 한 마디씩 들려오는데 / 침상은 쓸쓸하고 여러 책들 흩어져 있네 /언제나 안타까운 건, 백학대 앞의 물로서 / 산 입구를 겨우 나가면 곧 흙탕물이 된다네.” 정자에 우두커니 앉아 자연을 바라보는 은퇴한 선비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701032812048001